
평생 동안 공간 디자이너들을 가르쳐온 김문덕 교수.
그가 바라본 한국 실내 디자인계의 흐름과 주목할만한 신예 디자이너들
그가 바라본 한국 실내 디자인계의 흐름과 주목할만한 신예 디자이너들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다소 특이하고 감수성이 예민해 괴짜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공간과 분위기를 연출하며 예술가와 기술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 우리는 이들을 공간 디자이너라 부른다. 그렇다면, 그런 비범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최근 실내 디자인씬(Scene)의 주목을 받아온 젊은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김문덕 교수의 제자이거나, 그에게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거나, 최소한 그의 이름 석 자를 알고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디자이너들을 가르쳐오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온 김문덕 교수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트렌디하고 날카로운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최근 한국 실내 디자인 업계의 흐름과 학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 퀸마마마켓 내 협력상회 프로젝트-임태희디자인스튜디오
Q. 국내 실내디자인 학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다. 그동안의 세월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A. 70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건축사무소를 거쳐 인타디자인이라는 실내디자인과 전시를 같이 하는 사무실에 들어가며 실내디자인을 접하게 되었다. 1989년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 학과의 전임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는 홍익대학교 산업 미술대학원의 실내 디자인 전공 수업을 했었다. 중간중간 후배들과 건축사무소 일도 하고, 실내 디자인 사무소의 프로젝트도 도와주면서 현장과 강의실 양쪽에서 실내디자인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서울 지역의 실내디자인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Q. 현재 한국 실내 디자인계의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A. 한때 인테리어 디자인계의 흐름을 이끌던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쇠퇴하면서 그다음 세대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의 한국 실내 디자인계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얼마 전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플래그쉽 스토어의 대두 이후, 실내디자인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나는 이를 젠틀몬스터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젠틀몬스터 플래그쉽 스토어는 상업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넘어, 놀라움과 설렘이라는 감성적 체험을 제공하는 전시장 같은 스토어로 이슈를 만들고 있다. 이를 필두로 과거 ‘상업공간은 이래야 한다’는 공식들이 SNS 마케팅 등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도 전보다 훨씬 빠르다. 한편, 여러 공간들은 시각적으로는 세련되어졌을 지 몰라도 개성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잃어가는 이유에는, 인터넷을 통해 본 트렌디한 공간의 시각적 이미지만을 구현하려 한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Q. 현장을 많이 찾아 다니는 것으로 알고있다.
A. 아직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현장을 사진으로만 보고 그 공간을 파악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공간은 그곳을 찾아보고 걸어보고 만져보면서 동시에 현장의 분위기, 빛, 소리와 냄새 등 여러 부분들을 공감각적으로 느껴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건축적 시도를 해온 건축가 이타미 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돌의 아름다움도 강과 물과 이끼가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그중 하나만 없어도 제 아름다움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에 공감한다. 강과 물과 이끼를 만져보고 제대로 느끼지 않고서는 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프로젝트의 사진만 보고 ‘돌’을 파악했다 착각하고, ‘강’과 ‘물’과 ‘이끼’는 빠뜨리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 레디투웨어x르케시미어 -라보토리

© 저집-스튜디오 베이스
Q. 제자들이나 후학들에게 추천할만한 국내외의 공간으로 어떤 곳을 거론할 수 있나?
A. 석, 박사 학생들과 ‘공부가 될 수 있는 공간들’ 위주로 답사를 다니면, 서울 지역에 있는 공간 중에 가장 인상적인 공간으로 ‘윤동주문학관’과 ‘저집’을 많이 거론하더라. 이소진 건축가가 설계한 윤동주문학관은 기존에는 아파트에 물을 대는 가압장 같은 시설이었다. 상부를 개방해 시인이 별을 헤던 하늘이 보이게 하는 등 윤동주 시인의 시적인 감성을 현상학적으로 잘 표현해냈다. 스튜디오 베이스의 ‘저집’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연못’이라는 컨셉을 잘 적용한 공간이면서, 무겁지 않고 경쾌한 느낌의 한국적 이미지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외국의 공간들은 너무 다양하기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을 꼽자면, 도쿄를 답사하면서 학생들이 항상 손에 꼽는 공간으로 다니구치 요시오의 ‘호류지(法隆寺)보물관’이 있다. 또, 지난 여름에 다녀온 니시자와 류에의 ‘테시마 아트뮤지엄’도 인상적이었다. 학생들과 함께 비가 내리던 날 찾아갔었는데, 한 학생은 뮤지엄 안에 들어가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
Q.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실내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있는지?
A. 앞서 언급한 ‘저집’의 스튜디오 베이스(Studiovase) 외에도 자랑스러운 제자 디자이너들이 많다. 레디투웨어 x 르케시미어 프로젝트의 라보토리(Labotory), 앤더슨 벨 매장 프로젝트의 스튜디오 언라벨(Creative Studio Unravel), 퀸마마 마켓 내 협력 상회를 디자인한 임태희디자인스튜디오 등 다른 공간 디자이너들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제자들의 작업이 인상적이다. 한편, 제자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디테일이 감각적인 푸하하하 프렌즈(FHHH Friends)나, 카페 공간 디자인이 부각되는 더 퍼스트 펭귄(The First Penguin)의 새로운 시도, 조명을 이용해서 설치 미술 같으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어니언 미아점의 패브리커(Fabrikr) 등,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디자인 그룹에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서울의 실내 공간에 대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위 ‘핫’하다는 공간 대부분을 답사 다니고 있는데, 이런 젊고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지금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 앤더슨 벨-스튜디오 언라벨
Q. 제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A. 요즈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 과거에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학생들이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미래의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는 유능한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 디자이너란 디자인 작업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디자이너다. 작업 중에도, 평상시에도 자신이 디자이너라는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하물며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단순히 신변잡기를 수집하는 창구로 활용하기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디자인적으로 연관 있는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디자이너의 길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이기에 그런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쨌든 학생들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는 몇몇 학생들은 벌써부터 디자이너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Q. 앞으로 한국의 실내디자인이나 건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한국의 디자이너가 한국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알 때, 비로소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큰 이유도, 일본 젠(Zen, 禅) 스타일을 공간 안에 녹여내 평온하고 명상적인 공간을 창조했기 때문일 것이다. RCR이라는 스페인 건축가 팀이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이 서구의 문화와 함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녹여서 표현할 줄 아는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것을 모르면서 디자인한 공간이 세계인들의 가슴에 공감을 얻게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에 항상 한국건축과 실내라는 과목을 꼭 들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차주헌
저작권자 ⓒ Deco Journa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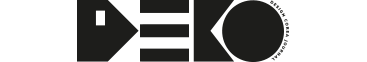










0개의 댓글
댓글 정렬